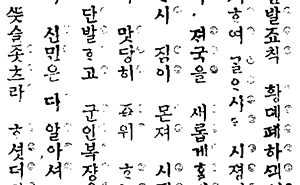경복궁 근정전 마당에 깔린 박석
경복궁 근정전 마당에 깔린 박석
조선시대 궁궐 정전이나 어도(御道)에는 두께가 얇고 넓적한 박석(礡石)이 깔려있다. 박석은 건물 외부 바닥을 포장하는 부재로, 경복궁 근정전의 마당인 조정(朝廷)에 깔린 박석은 거칠게 다듬어져 햇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줄여주었다. 또한 표면이 거칠어 미끄러운 가죽신을 신은 대신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었으며,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배수가 되도록 하였다. 박석의 자연스러운 형태와 여러 기능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했던 조선의 건축에 어울리는 훌륭한 부재였다.
조선시대 궁궐 공사 때 사용된 석재는 돌의 중량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채석하려 했다. 1667년 종묘 영녕전 수리 때는 서울 외곽의 조계산에서 채석하였고. 18세기 궁궐 공사 때는 창의문 밖이나 남산 아래 인근에서 채석했다고 한다. 또는 민간에서 석재를 구입하거나 민간의 가옥 철거 시 나온 석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민간의 석재는 대부분 작고 열악해서 궁궐 등에 사용하기는 부적합했다고 한다. 궁궐 공사 때 사용한 다양한 용도의 석재들은 서울 가까운 곳에서 얻었지만, 바닥에 깔리는 박석은 인천의 강화 석모도와 해주에서 채석한 것만 사용하였는데, 특히 강화 석모도 박석을 사용하였다.
1647년(인조 25) 창덕궁 공사 때 사용된 박석은 모두 강화도에서 채석되었고, 1906년 경운궁 중건을 비롯해 20세기 초 대한제국 시절에 진행된 공사에도 석모도에서 채석한 박석을 사용하였다.
 강희언, <돌깨기>,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강희언, <돌깨기>,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채석작업은 먼저 암석을 덮은 표토를 괭이와 삽, 가래 등으로 걷어낸 뒤, 돌을 떠낼 위치를 먹줄로 선을 그어 표시했다. 그리고 정(釘)으로 구멍을 뚫고, 정보다 굵은 비김쇠[쐐기]를 그 구멍에 끼워 쇠로 만든 큰 망치로 내려쳐 돌을 떠낸다. 돌을 떠내는 과정은 18세기에 제작된 강희언(姜熙彦, 1738-1784)의 〈돌깨기〉를 통해 확인된다. 그림을 통해 보면 두 명의 석공이 한 조가 되어 작업을 진행한다. 좌측의 석공이 돌을 떠낼 위치에 정을 세워 위치를 잡고, 파편이 튈까 봐 얼굴을 돌리고 있다. 맞은편 젊은 석공이 쇠망치로 내려치는 모습이다.
채석된 석재는 석공으로 하여금 떠낸 곳에서 다듬어 무게를 줄여 실어 나르도록 했다. 일정한 형태의 크기로 다듬는 초련, 정교한 형태의 부재로 다듬어 모양을 내는 재련을 거쳤다.
석모도에서 채취된 석재들은 어떻게 도성까지 갈 수 있었을까.
강화도의 서쪽에 위치한 석모도에서, 수운을 통해 한강 유역을 비롯해 한반도 중앙부까지도 접근할 수 있었다. 석재는 용산강(龍山江, 용산)에 하역하여, 수레에 싣고 남대문을 통과하여 도성의 공사장에 이르렀다.
겨울에는 얼음 위에서 썰매로 운송하였고, 육지에서는 마차를 사용하거나 소가 끄는 달구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중량이 많이 나가는 석재는 높은 마차에 싣기가 어려워 바퀴가 낮은 수레를 이용했다. 육로 운송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의 상태 점검이었다. 운송이 이루어지기 전 도로를 점검하고 요철이 있는 부분을 보수한 후 운송이 시작되었다. 궁궐의 출입문과 요철이 있는 길은 문턱 부분에 흙이나 모래를 부어 길을 평탄하게 한 뒤 이동하였다. 이동된 석재들을 해당 장소에 배치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듬어 공사를 완성하였다.
박석은 궁궐 정전처럼 위상이 높은 건축공간에 한정한 부재였다. 심지어 경회루에 박석을 까는 것조차 꺼렸다고 하니 박석이 깔린 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이밖에도 석모도 박석은 궁궐뿐 아니라 강화 돈대축조에도 사용이 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까지 구들장에 사용되었으며, 오늘날 문화재수리에 사용되는 박석도 석모도에서 채석됐다. 2008년 광화문 복원공사, 2009년 숭례문 복구공사가 바로 대표적인 경우이다. 석모도 채석장 위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의 해명산이다. 한 번쯤 방문하여 채석하던 옛 모습을 그려보면 어떨까.
 해명산 표지석
해명산 표지석
글·사진 이정화(인천역사문화센터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