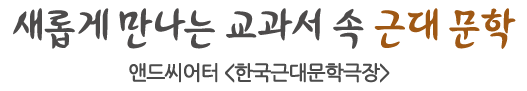

지난 12월 14일(수)부터 18일(일)까지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에서 <한국근대문학극장(예술감독 고홍진, 연출 조영, 신아리, 권근영, 이효진)>이 열렸다. 앤드씨어터가 2014년 ‘플랫폼 초이스’로 선정되면서 처음 선보인 <한국근대문학극장>은 올해로 3회째 진행되며 큰 반응을 얻고 있다. 중, 고등학교 국어시간에 자주 접하며 익숙해진 한국 근대 소설을 앤드씨어터만의 젊고 참신한 방식으로 풀어내며 ‘2015 유네스코 지정 세계 책의 수도 인천’ 기념행사와 인천 시내 다수의 고등학교에 초청되어 상연되기도 했다.
개항기부터 일제 강점기까지를 포함하는 근대에 탄생한 문학작품은 개항으로 인해 서양 문물이 도입되며 크게 변화한 사회상과 일제 강점기의 아픈 역사가 집약되어 있다. <한국근대문학극장>은 제도 교육 안에서 자주 읽히며 틀에 박힌 시각으로 분석되었던 근대 문학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발견하려는 시도다. 근대 소설을 연극으로 각색한다는 포맷은 유지하고 있지만 매회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다. 1인극으로만 구성했던 1회, ‘봄봄’, ‘날개’ 등 대표적인 근대 소설 8편을 각색했던 2회와 다르게 이번에는 소설가 이효석의 작품 4편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권근영 연출의 ‘도시와 유령’은 도시화로 인해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특히 1927년에 쓰인 소설에 드러난 문제 의식이 현대의 사회상과 여전히 일맥상통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인물들이 클럽에서 춤을 추는 등 현대적인 분위기를 통해 시대성을 감추고 도시의 소외된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소설 원작이 여자와 아이를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보여주었던 것과 달리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소외계층인 노동자, 유기견 등의 이미지를 안무와 노래, 음향을 통해 시각, 청각적으로 표현해냈다.
신아리 연출의 ‘장미, 병들다’ 또한 부당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약자의 모습을 그렸다. 갈등을 겪으며 대립하는 등장인물을 강자와 약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등장하는 인물 모두를 약자로 보고, 대항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나 권력, 검열 등을 강자로 보았다. 다양한 인물과 사건이 등장하는 작품 전체를 1인극으로 이끌어냈던 김광호 배우의 열연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도시와 유령’, ‘장미, 병들다’ 두 작품이 시대에 상관없이 유효한 보편적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시대성을 감추는 방법을 택했다면 조영 연출의 ‘메밀꽃 필 무렵’은 근대의 시대성과 이미지를 작품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작품 자체의 사건과 갈등에 집중하면서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왼손잡이, 나귀 등의 상징에 초점을 둔 일반적인 해석과는 달리, 옷감이라는 소재에 담긴 상징을 발견하여 작품을 재구성했다. 옷감은 어머니의 사랑과 선에 대한 긍정을 상징하며 허생원이 아들 동이를 알아보는 계기로 작동하기도 한다. 천으로 만든 소품들을 활용하여 옷감의 상징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이효진 연출은 작품 이전에 소설가 이효석이라는 인물 자체에 주목했다. ‘하얼빈’과 ‘낙엽을 태우면서’ 두 작품을 작가가 주인공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어 서술한 사소설(私小說)로 보고, 그 안에 드러난 작가로서의 내적인 갈등을 포착했다. ‘하얼빈’이 이상향을 향해 도피하고자 하는 작가 자신의 모습을 담고 있다면 ‘낙엽을 태우면서’는 현실과 생활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이효진 연출은 두 작품을 하나로 엮음으로써 예술가로서 겪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 그리고 갈등을 드러냈다.

그동안 교과서에 등장하는 근대 문학작품은 따분하고 지루하기 그지없었다. 상징적인 소재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선생님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적고, 시대를 드러내는 소재에는 동그라미를 치며 읽어야 했다. 하지만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근대 문학이 계속해서 읽히고 회자되는 것은 달라진 사회상을 반영하여 새로운 해석과 끊임없는 재발견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시대가 달라지고 사회상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한 보편적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교육의 주입으로 작품을 주체적으로 만나는 것이 낯설다면 <한국근대문학극장>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가보면 좋겠다. 선생님이 알려준 곳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한 새로운 곳에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글 / 김진아(인천문화통신 3.0 시민기자)
사진 / 앤드씨어터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