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화통신3.0은 2020년 9월부터 지역 문화예술계‧시민과 인천문화재단과의 소통을 위해 <유쾌한 소통>이라는 이름의 기획 인터뷰 자리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매달 2개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각계각층의 시민과 예술인들을 만날 예정이다.
<기획 인터뷰-유쾌한 소통 2>
나와 우리가 연결되는 문화예술강의의 즐거움최서연 씨 인터뷰
홍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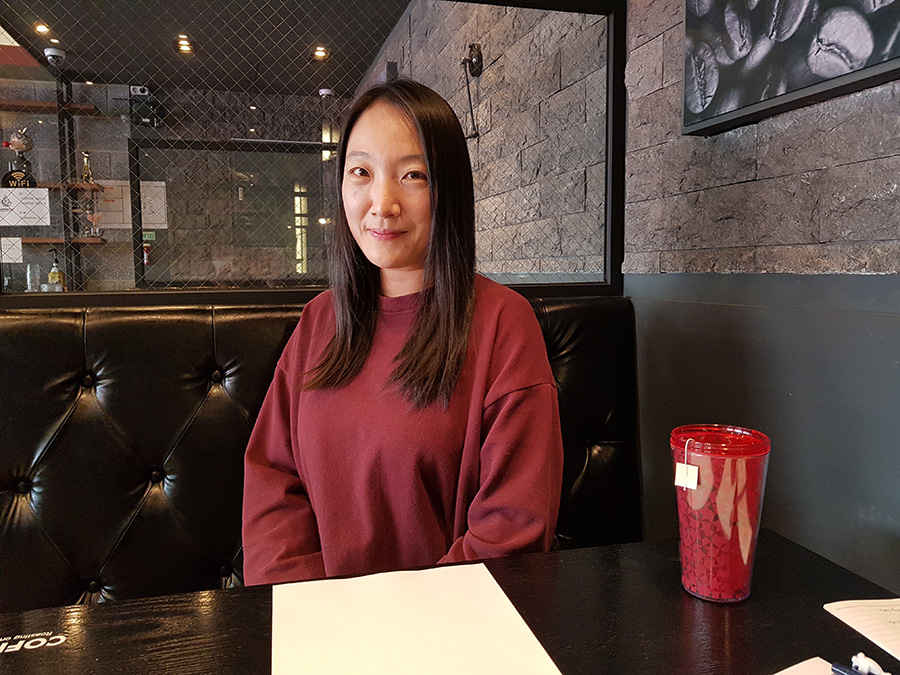
“무용을 가르칠 때 내가 빨간색이고, 엄마일 때는 파란색이라면 문화강의를 듣는 나는 비로소 내 색깔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주체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자 인천에 있는 자원들과 연결되는 시간이라고 느낍니다.”
최서연 씨(40세)는 인천에서 나고 자라 지금도 인천에 살고 있다. 인천을 고향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컸지만,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은 조금도 없다. 한 아이의 엄마이자 무용강사로 학생들과 만난다. 그리고 인천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문화예술교육의 열혈 수강생이다.
지난 3월 말 연수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최 씨는 그동안 들었던 강의와 그곳에서 있었던 기억을 하나둘 끄집어내며 들뜬 표정을 했다. 지금은 다양한 강의를 듣는 것이 삶에 스며들었지만, 처음은 다른 시민들처럼 낯설고 궁금했다.
최 씨가 처음 문화예술 강의를 듣게 된 계기는 반려동물과의 이별이었다. 2017년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그는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하늬바람에서 <반려동물과 문화예술> 강좌가 열린 것을 보고 지원했다. 누구나 조금의 관심만 가지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낀 그는 이후부터 <즉흥연극 워크샵>과 <야근대신 바느질>, <창의적 삶 조직하기>, <i신포니에타와 함께하는 클래식 톡톡 ‘들어봄직, 알아봄직’>, <펜 하나로 꺼내는 일상여행> 등 모두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배우고 또 배웠다. 처음 강의를 들으러 다니던 시절에는 4~5살이었던 아이도 동반해서 다녔는데, 그때 받은 배려들이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최 씨는 “당시에 아이를 데려오는 사람이 혼자 밖에 없었어요. 강의는 듣고 싶은데 엄마라서 애는 봐야 하고 난감했죠. 그래도 배우고 싶은 욕심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다녔는데 혹시나 민폐가 될까 항상 걱정했어요. 한 번은 성인들이 집중해서 듣는 강의에 아이를 데려갔다가 안 데려갔더니 오히려 사회자분이 아이를 찾으시더라고요. 열린 강좌이기 때문에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와도 된다면서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나를 배려해주시는구나. 여기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장이 열리나.’ 그게 큰 힘이 됐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있어 문화예술강의가 하나의 ‘환기’라고 설명했다. 자기 업무와 꼭 해야 되는 역할 외에 나를 돌아보고 환기하고 치유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다. 친구와의 수다도 좋지만 너무 자주 하면 소진하는 기분이 든단다. 그때 관심분야의 강의를 들으면 꽉 채워지는 느낌이다.
또한 최 씨는 지역에서 이뤄지는 강의들이 인천이라는 터전으로 삶을 확장하는 매개가 된다고 말했다. 그에게 인천이라는 곳은 잠만 자는 곳이었고, 항상 서울에 가서 일하고 서울에서 공부했다. 하지만 세월 지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내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화예술 강의를 들으며 이런 생각은 더 짙어졌다.
최 씨는 “인천에서 여러 강의를 듣다보면 내가 사는 동네에 안정감이 느껴져요. 아는 가게가 생기고 아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곧 경계심이 풀린다는 것이죠. 인천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궁금하고, 또 찾아보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지역의 일원이 되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활동으로 느슨하지만, 네트워크가 생긴 게 가장 좋아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그렇기에 그는 더 많은 동네 거점을 활용한 강의들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부러 가야하는 공간보다 시민들이 종종 가는 카페나 식당, 주민센터 등 원래 사람들이 오는 장소에서 뭔가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다.
최 씨는 “다들 문화를 향유하고 싶고 접하고도 싶은데 방법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요. 도서관이나 인천아트플랫폼 같은 곳 말고도 주민들이 자주 오는 장소, 사람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곳에서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홍보도 중요하겠지요.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강의 정보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린아이를 키워서인지 모르겠지만 전시든 뭐든 온 가족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고 알려졌으면 합니다. 너무 좋은 것을 저만 혜택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면 참 아쉬워요.”라고 제안했다.
그는 지역 문화강좌의 열혈 수강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무용 강사로 살아가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용을 통해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나에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법을 가르친다. 몸으로 움직이면서 배려를 배우고, 상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가르친다는 것이 최 씨의 교육 방침이다.
최 씨는 “모든 움직임은 무용이 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몸짓을 하면서 다양성을 읽고 이해할 수 있죠. 처음에 이 친구가 어떻게 표현해도 놀리거나 틀렸다고 하지 않도록 받아주는 연습을 한 달 동안 해요. 비난받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 생각이 들면 아이들도 눈치를 보지 않게 되죠. 수업 안에서 서로의 경계를 허물려고 그룹이 교체되는 활동을 계속해요.”라고 설명했다.
문화예술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그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연결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단다. 개인이 고립되기 쉬운 사회에서 문화수업들을 통해 연결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 돌보고 챙길 수 있도록 소그룹 단위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한다.
최 씨는 “요즘 사람들은 꾸준히 내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아요. 문화예술이 일회성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데이 강좌나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강의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전에 타깃을 두고 조사나 연구를 해도 좋고요. 공간 접근성이 좋든, 내용이 친숙하든 다리가 될 만한 것이 있었으면 해요. 본질을 갖추면서도 사람들이 ‘괜찮네’ 생각할 수 있도록 말이죠.”라고 말했다.
배우는 것이 정말이지 즐겁다는 그가 앞으로 꿈꾸는 삶은 지금의 배움을 토대로 더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드는 것이다. 마을에서 어르신과 엄마들,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벌이고 싶고, 지금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최 씨는 “제가 사는 중구에는 학령기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문화 자원이 정말 많아요.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문화예술로 가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제 나이 50살이 되기 전에는 지역에 도움이 되면서 재미있는 동네를 만들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 됐든 연대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미래를 그리며 웃어 보였다.
인터뷰 진행/글: 홍봄(기호일보 사회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