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란한 봄날을 애도하며
인천시립교향악단 362회 정기 연주회
지난 4월 7일 저녁,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제362회 정기연주회에 다녀왔다. 올해로 창단 50주년을 맞이한 시립교향악단은 지난 2011년부터 모든 연주회를 시리즈로 구상하고 있다. <찬란한 봄날을 애도하며> 라는 다소 모순적인 제목으로 열린 이번 연주회 프로그램은 지휘자 정치용의 지휘 아래 라인홀트 글리에르(R. Gliere)의 「호른 협주곡」을 호른 연주자 김홍박과 협연한 후, 안톤 부르크너(A. Bruckner)의 「교향곡 제7번」을 연주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연주회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고백부터 해야 할 것 같다. 필자는 음악에 대해 완전 문외한이다. 클래식 공연을 단 한 번도 관람해 본 적이 없으며, 오케스트라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우리의 노다메 쨩(우에노 주리, 일본드라마 노다메칸타빌레의 여주인공)과 신이치 센빠이(타마키 히로시, 남주인공)의 ‘연애 대서사’를 그린 <노다메 칸타빌레>를 보고 주워들은 게 고작이다. 심지어 필자의 휴대폰 음악 플레이리스트에는 가수 아이유 씨의 앨범이 2년 째 바뀌지도 않고 그대로 들어있다. 이번 시립교향악단의 연주회도 처음이라 긴장이 되었는지, 1층 R석이 부담스러워 2층 S석 표를 예매했다. 물론 연주회가 시작되자마자 후회했지만 말이다. 이는 이번 연주회에 대해 필자가 하는 이야기가 절대 전문적인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저, 일반 관객의 자유로운 해석쯤으로 귀엽게 읽어주길 바란다. 필자에 관한 부끄러운 얘기는 이쯤으로 하고, 다시 연주회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연주회를 관람한 관객 중 한 분이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왜 봄날을 애도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분명 <찬란한 봄날을 애도하며>라는 제목에는 어딘가 모순적인 면이 있다. 새싹이 돋고 벚꽃이 만개하는 ‘봄날’에 ‘애도’라는 낱말이 짙은 미세먼지처럼 우중충 내려앉아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소설가 ‘이상’ 은 그의 작품 <12월 12일>에서 “모든 것은 모순이다. 그러나 모순된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만큼 모순이라는 것은 진리이다. 모순은 그것이 모순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던가?(이상, 『이상 단편선 날개』; 「12월 12일」, 문학과지성사, 2005, p.88) 굳이 그것을 ‘진리’라고 과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찬란한 봄날을 애도하며> 라는 글귀를 따라가는 것이 이 정교하게 짜인 오케스트라의 악보를 독해하는데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글리에르에서 부르크너로 이어지는 연주회의 프로그램이 이미 그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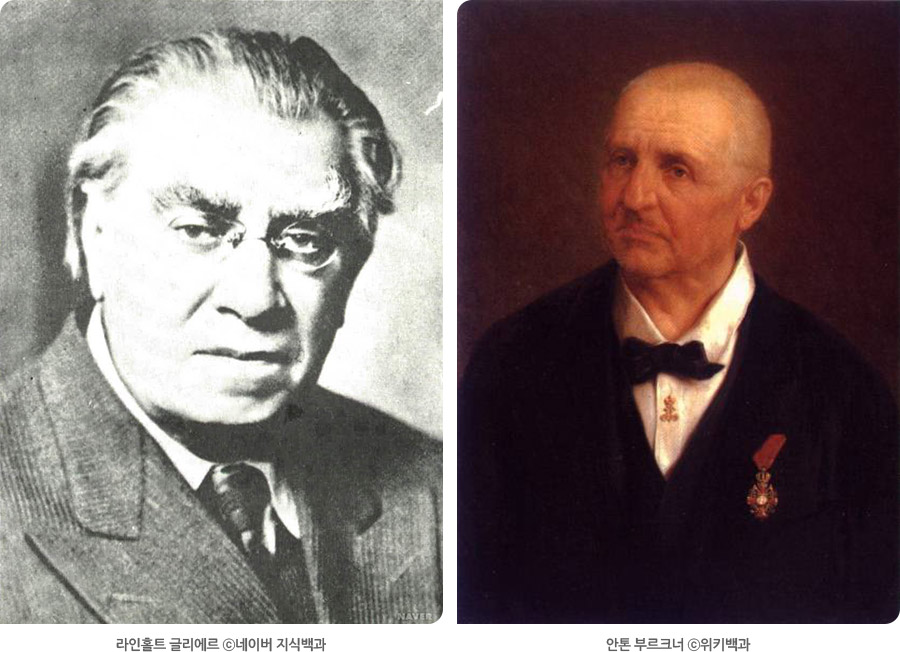
글리에르는 우크라이나 태생 20세기 러시아 낭만주의 작곡가로 그의 「호른 협주곡」은 호른 레퍼토리 중 가장 사랑 받는 작품 중 하나라고 한다. 러시아의 민속적 요소를 포함해 호른과 오케스트라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은 특히 인상적이다. 마치 구소비에트 연방의 활기찬 민중행진 곁에서 덥수룩한 수염에 푸짐한 인상을 지닌 광대가 콧노래를 하는 듯하다. 호른이 굵직한 저음과 가느다란 고음을 오갈 때, 우리는 구슬픔과 익살스러움을 동시에 느낀다. 반면, 부르크너의 음악은 웅장하고 두텁다. 그 중후한 화음은 신비로운 세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묘사한다. 특히 부르크너의 「교향곡 제7번 2악장」은, 그가 평생 경모해마지 않던 바그너의 죽음을 예감한 순간에 쓰였다고 한다. 염세와 절망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바그너. 그런 그를 동경한 부르크너의 음악에서 느껴지는 비극적 파토스는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크너에 대해 좀 더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미술사가로 유명한 에른스트 곰브리치(E. Gombrich)는 1945년 영국 런던의 BBC 월드 서비스에서 청취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그는 독일 라디오방송을 듣던 중 심상치 않은 조짐을 발견하고 이를 즉각 상부에 보고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일 방송에서 곧 모종의 발표가 있겠다며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 2악장을 내보내고 있다. 이 악장은 브루크너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죽음을 추모하며 쓴 것이다. 바그너는 히틀러가 경모했던 작곡가이기도 하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히틀러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음악 칼럼니스트 유윤종, 「[서양 음악사의 뒤안길] 미술학자, 음악을 듣고 히틀러의 죽음을 맞히다.」 중 인용, 자세히 보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제국의 몰락을 알렸던 부르크너의 「교향곡 제7번 2악장」.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글리에르와 부르크너의 음악을 듣는 건 어떤 의미인가? 찬란한 봄날을 애도한다는 이 모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근 서해에서는 새싹이 땅을 비집고 나와 고개를 빼꼼 들어내듯, 심연에 잠겨있던 허약한 종이배 하나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웅장하지만 녹이 슬어있었다. 봄날에 꽃처럼 바다 한가운데에서 피어난 종이배를 보며, 우리는 당분간 더할 나위 없는 애도를 표해야할 것이다. 봄과 애도, 이 모순을 우리는 철학용어를 빌어 아포리아(모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막다른 골목’, ‘출구 없는 상황’을 뜻하는데, 이 어원은 종이배의 카타스트로프(파국)를 재현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 종이배는 카타스트로프(대단원)의 기호로서 ‘역전’을 예고하고 있다. 몰락에 대한 목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애도를 요구한다. 이 두 애도는 글리에르의 호른처럼 한편으론 구슬프게, 다른 한편으론 즐겁게 연주될 것이다.

글을 끝내면서 필자가 음악에 문외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야겠다. 필자는 클래식 음악이 전하는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본 글의 내용은 이번 연주회를 연 시립교향악단의 목적과 하등 상관이 없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필자에겐 이번 시립교양악단의 연주회가, 최근 “소리 반, 공기 반”의 미덕을 가르치며 글로벌한 양식으로 정전화되고 있는 K-pop보다 우리의 삶에 더 가까워보였다. 삶을 초과하는 예술이란 산업을 겨냥한 탐미주의로 귀결될 뿐이다. 차라리 봄의 소리에 귀기울여보는 게 어떨까? ‘봄 위에서 노래함’이란 큰 주제로 시작된 시립교향악단의 봄 시즌 프로그램은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두 차례 더 열릴 계획이다. <챔버 뮤직 페스타>는 4월 25일(화) 소공연장에서, <브람스 그리고 브람스>는 5월 26일(금) 대공연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필자도 다음엔 R석으로 표를 끊어보려 한다.
글/ 박치영 인천문화통신3.0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