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바다가 보이는 거리에서 공연하고 싶어요”
극단 <나무> 기태인 대표
공연과 행사로 활기가 넘쳐났던 5월. 그 여운을 잠시 뒤로한 채 이번 6월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감하는 공연을 소개하고자 한다. 오는 6월 14일 남동소래아트홀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인생 이야기 <이야기 하루>의 공연이 시작한다. <이야기 하루>를 통해 전달되는 그분들의 이야기에는 아이들이 모두 헤아리기 어려운 삶의 깊이와 짙음이 묻어있다.

극단 명을 <나무>라고 지은 계기가 있는가요.
예전 ‘사다리’극단에서 배우로 활동했을 때 일본 어린이 극단과 교류 사업을 했던 적이 있었다. <만남>이라는 작품으로 모인 한국과 일본팀 6명이 자그마한 초등학교에 방문했었는데 공연을 마치고 출발하려고 할 때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묘하게 푹 파인 나무에 앉아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에게 그 좁은 공간이 놀이터였던 것이다. 그 당시 아이들을 감싸고 있던 나무의 모습이 인상 깊어 예술단체를 만들면 ‘나무’라는 이름을 지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극단명의 의미에 친환경을 크게 표방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폐기물로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극단 <나무>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는 환경에 중점을 두기보다 생활에서 익숙하게 쓰이는 물건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길 원한다. 쉽게 말하면 재활용품을 하나의 오브제로 보고 있다. 재활용품은 일상에서 가까운 소재이기 때문에 쉽게 지나치지만,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예를 들면 <벨로시랩터의 탄생>이라는 작품은 신문지를 활용하여 멸종된 공룡을 표현하는 거리 공연이다. 관객은 공연을 통해 즐거움을 얻지만, 공연이 끝나고 돌아갈 때 ‘왜 신문지로 공룡을 만들었지?’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기를 기대한다.
오브제로 쓰이는 물건을 신중하게 선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도 명확해야 하지만, 물건의 선택도 중요하다. 표현하려는 이야기와 오브제 사이에 간극이 좁을수록 좋다. 아무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에 맞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국자로 공연을 하면 그것은 ‘부엌에서 쓰는 물건’, ‘우리 엄마가 항상 잡는 물건’ 등의 서브 텍스트들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살려서 작품을 만들어간다.
6월 14일에 공연하는 작품 <이야기 하루>에서 종이를 오브제로 선정한 계기가 있는가요?
빈 우유병으로 로켓을 만들어 달나라에 다녀오는 4명의 광대 이야기 <상상놀이 얘들아! 같이놀자>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하루>작품이 떠올랐다. 어느 날 우연히 종이를 보았는데 종이의 질긴 질감을 사용해서 인생 이야기를 표현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을 다루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공감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출가의 입장에서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어린이들에게 ‘인생’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고민했다. 그러다 문득 우리 옆집 사는 할아버지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듯 전달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공연할 때 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표정은 물음표일 때가 많다. 그러나 아이가 공연 내용을 전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전제로 이 작품을 시작했다. 공연이 끝나고 아이와 부모가 작품에 대해 묻고 답하며 둘 사이에 새로운 만남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작품에 대해 공감하기 어려운 아이들도 먼 훗날에 그 이야기를 회고하는 날이 언젠가 올 것이다. 궁극적으로 작품에서 ‘삶은 아름답다’, ‘삶은 즐겁고, 좋은 추억의 연속이다’를 전달하고 싶다. 계몽적이거나 교훈적이기 보다는 넌지시 던질 뿐이다. 너희들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가 너의 삶에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드러내려고 한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작품을 제작하는가요?
우리 작품의 대부분은 공동창작이다. 단원들과 주제 하나를 제시하고 파생되는 아이디어를 함께 그려가며 이야기를 구성한다. 특정 대본을 가지고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신(Scene)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통해 신을 정리하며 하나의 작품을 완성한다. 매번 진행되는 공연이 하나의 대본을 완성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연기는 굉장히 창의적인 작업이라 생각하는데, 대본이 배우들의 상상력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이야기 하루>는 2013년 초기에 제작한 작품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의 감정선이 섬세해졌고 작품에서 표현하려는 텍스트가 명확해졌지만, 안타까운 점도 있다. 공연 초기에 총 네 분의 배우와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악사 분이 계셨는데 도중에 연주자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셨다. 당시에 아코디언은 이 작품을 아우르면서 할아버지의 향수를 자극하는 중요한 장치였다. 게다가 연주자께서 배경음악을 직접 작곡, 편곡하면서 부산국제연극제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쾌거도 이뤘다. 그 분이 떠나기 3개월 전 이 작품을 계속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분이 문득 생각나면서 이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그 분의 음악을 최대한 살려서 국악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분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강하다. 앞으로 그 역할을 대신할 누군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 그 부분에 대해 다시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일반 극과 달리 인형극이 주는 매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요?
배우가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인형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형은 관객에게 상상력을 자극하고 다른 여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매력을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 그들이 표현하는 이미지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의 표현이 인형이 아닌 창작자의 몫이기에 충분한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Robot PEPUM>과 <벨로시랩터의 탄생> 등 거리공연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공연하는 느낌은 공연 무대와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연장이라는 문턱을 부스고 관객과 가까이 공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관객에게 더욱 현실감 있는 작품을 선보여야 하고 환영이라는 장치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인다. 공룡을 완벽한 모습으로 제작하기보다 특징을 살려 제작할 때 비로소 공룡 안에 있는 배우의 까만 다리가 보이지 않게 되며, 관객들은 공룡이 살아있다고 느낀다. 이것이 바로 환영이라는 장치인데 공룡의 실제 무게감을 살리기 위해 입과 다리의 움직임, 목의 각도 등을 짐작하면서 몇 차례 수정작업을 거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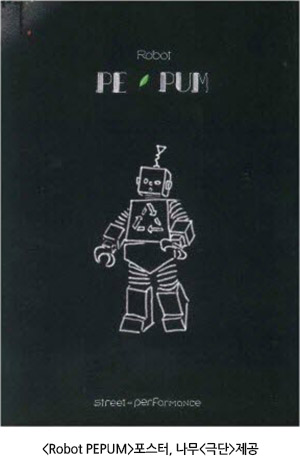
여러 지자체에서 거리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거리공연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은 어떤가요?
2006년 <Robot PEPUM>이라는 거리 퍼포먼스를 했고 이후에도 거리공연에 흥미가 생겨 신문지 공룡을 만들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손꼽히는 몇 개 팀 정도밖에 없었는데 현재는 무용, 미술 등 다양한 장르들이 거리공연을 채우고 있다.

인천에서 진행되는 거리공연에서 인천만의 특수성이나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거리공연 수요는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콘텐츠가 현저히 부족하여 매번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과거보다 거리공연을 펼칠 기회는 확실히 많아졌다. 그러나 공연장과 별개로 콘텐츠 제작을 위한 환경들이 빠른 시일 내로 구축되어야 거리축제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거리공연을 펼칠 때 거리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연하고 싶은 특정 거리가 있는가요?
언젠가는 세월호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싶다. 비록 어떤 식으로 관객에게 다가가야 할지 구체적인 구상은 없지만, 그곳이 바다가 보이는 거리였으면 좋겠다.
사진/글
이진솔(정책연구팀)